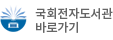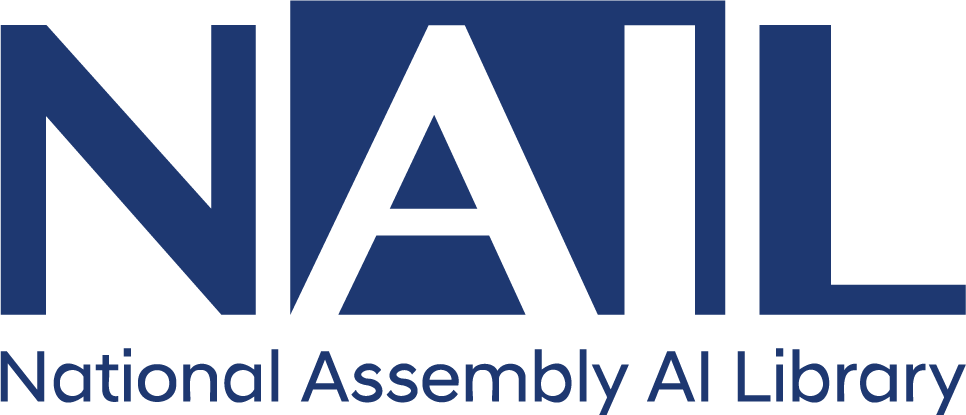□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임
-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 둘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미국이 구상하는 방식대로 동맹 현대화가 추진된다면,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한미 지휘체제 전반에 큰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음
□ 동맹 현대화를 견인하는 대표적 논리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최우선론’임
- 콜비 차관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 견제가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적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 전통적 패권 외교를 비판하면서도, 대만해협을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역 헤게모니 판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함
- 이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미국의 주요 자산이지만, 그 성격과 역할은 중국 견제에 기여하는 한에서 철저히 수단적 지위로 격하됨
- 국방부가 주도하는,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 전략에 동조화하려는 구상이 실제로 정책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함
□ 해외 주둔 미군 태세 조정과 관련해 가장 급진적인 제안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전 선임고문 댄 콜드웰(Dan Caldwell)과 워싱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Defense Priority)의 제니퍼 캐버너(Jennifer Kavanagh) 선임연구원에 의해 제기됨
- 이들은 2025년 7월 9일 공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약 2만 8천 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약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철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임
- 이러한 전면적 재조정론은 기존 미국 대외전략과도 결이 다르고, 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비교해도 주류적 견해는 아니며,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국을 염두에 둔 인·태 전략 속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작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도 존재함
- 북한 위협 대응과 중국 견제를 별개의 임무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문제로 보며, 한반도의 군사적 자산이 대만해협 분쟁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주한미군 기지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작전적·군수지원 허브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역내 분쟁 발생 시 미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을 넘어, 상시 배치와 순환 배치가 융합된 ‘역동 전력(dynamic force)’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전자전·사이버전·무인 전력 등 능력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주한미군은 사실상 극동사령부로 발전해 동북아 전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 한반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역내 분쟁 시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작전적 가치 때문임
- 북한 위협과 대만해협 분쟁의 연계성을 강조함
□ 동맹 현대화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음
- 한미동맹 현대화는 단순히 한반도 차원에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미군 태세 조정의 큰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내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할 NSC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임
□ 현재로서는 동맹 조정론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함
- 한국은 동맹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미국의 전략 사고 저변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과 능동적 동맹 재설계를 고민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 둘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미국이 구상하는 방식대로 동맹 현대화가 추진된다면,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한미 지휘체제 전반에 큰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음
□ 동맹 현대화를 견인하는 대표적 논리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최우선론’임
- 콜비 차관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 견제가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적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 전통적 패권 외교를 비판하면서도, 대만해협을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역 헤게모니 판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함
- 이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미국의 주요 자산이지만, 그 성격과 역할은 중국 견제에 기여하는 한에서 철저히 수단적 지위로 격하됨
- 국방부가 주도하는,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 전략에 동조화하려는 구상이 실제로 정책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함
□ 해외 주둔 미군 태세 조정과 관련해 가장 급진적인 제안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전 선임고문 댄 콜드웰(Dan Caldwell)과 워싱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Defense Priority)의 제니퍼 캐버너(Jennifer Kavanagh) 선임연구원에 의해 제기됨
- 이들은 2025년 7월 9일 공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약 2만 8천 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약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철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임
- 이러한 전면적 재조정론은 기존 미국 대외전략과도 결이 다르고, 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비교해도 주류적 견해는 아니며,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국을 염두에 둔 인·태 전략 속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작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도 존재함
- 북한 위협 대응과 중국 견제를 별개의 임무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문제로 보며, 한반도의 군사적 자산이 대만해협 분쟁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주한미군 기지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작전적·군수지원 허브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역내 분쟁 발생 시 미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을 넘어, 상시 배치와 순환 배치가 융합된 ‘역동 전력(dynamic force)’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전자전·사이버전·무인 전력 등 능력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주한미군은 사실상 극동사령부로 발전해 동북아 전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 한반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역내 분쟁 시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작전적 가치 때문임
- 북한 위협과 대만해협 분쟁의 연계성을 강조함
□ 동맹 현대화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음
- 한미동맹 현대화는 단순히 한반도 차원에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미군 태세 조정의 큰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내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할 NSC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임
□ 현재로서는 동맹 조정론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함
- 한국은 동맹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미국의 전략 사고 저변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과 능동적 동맹 재설계를 고민해야 함
목차
서론 1
중국 우선 진영의 동맹 조정론 2
전략적 후퇴(pivot home) 진영의 동맹 축소론 4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입각한 동맹 확장론 5
전망과 대응 6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