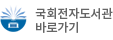1950년대 국제사회에서 IOC의 ‘승인(Recognition)’은 신생 독립국들에는
‘국가 건설(Nation Building)’ 과정에서 ‘국가성’ 인정의 의미를 갖고 있었음. 북한은 올림픽 참가를 위해 1952년부터 IOC와 접촉하여 1969년에 가서야 DPRK 국호를 인정받아 완전한 승인(Full Recognition)을 받고, 1972년
뮌헨올림픽은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를 보인 첫 사례
가 됨. 이후, 1990년까지 북은 ‘단일팀(통일)’ 남은 ‘개별팀(두 국가)’ 전략
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1991년에 남한 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일시적
단일팀을 구성했지만, 신보수 세력의 등장과 함께 단일팀(통일)의 기대감은 과거로 회귀함. 국제사회에서는 남과 북을 동등한 분단국가로 바라보았으며,
올림픽과 같은 평화를 지향하는 공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음.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국가 건설(Nation Building)’ 과정에서 ‘국가성’ 인정의 의미를 갖고 있었음. 북한은 올림픽 참가를 위해 1952년부터 IOC와 접촉하여 1969년에 가서야 DPRK 국호를 인정받아 완전한 승인(Full Recognition)을 받고, 1972년
뮌헨올림픽은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를 보인 첫 사례
가 됨. 이후, 1990년까지 북은 ‘단일팀(통일)’ 남은 ‘개별팀(두 국가)’ 전략
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1991년에 남한 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일시적
단일팀을 구성했지만, 신보수 세력의 등장과 함께 단일팀(통일)의 기대감은 과거로 회귀함. 국제사회에서는 남과 북을 동등한 분단국가로 바라보았으며,
올림픽과 같은 평화를 지향하는 공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음.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남북 체육 영역에서 본 ‘두 국가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