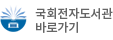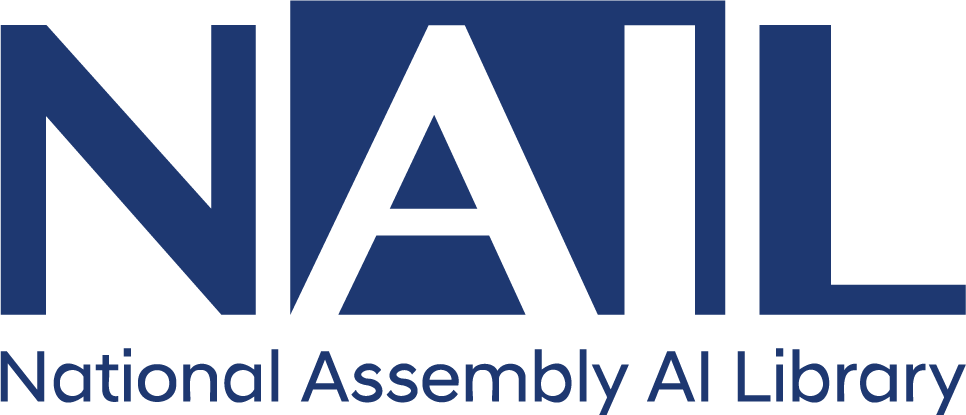중국은 과학기술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재 확보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왔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이다이허 회의이다. 과거 정치 원로들의 비공개 회의 공간이던 이곳에 최근에는 양자물리,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과학자들이 초청되고, 지도부가 직접 격려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인재를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다. 중국의 인재전략은 2008년 ‘천인계획’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해외 고급 인재를 고액 보상, 연구비, 정주 지원 등을 통해 귀국·유치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연구 리더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지식재산 유출 의혹과 이중 소속 문제로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으면서 2019년 ‘치밍’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보다 은밀하고 맞춤형으로 설계된 고급 인재 스카우트 체계다. 국내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만인계획’도 주목된다. 청년 과학자, 응용기술 전문가, 혁신기업가 등 1만 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장강학자상’을 통해 국내 연구자에게 명예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외 유치와 국내 육성을 병행하며 인재의 ‘이중 사다리’를 구축했다. 이러한 인재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긴밀히 결합하였다. 반도체, AI, 바이오, 항공우주 등 전략 산업 육성의 병목은 인재 부족이었는데, ‘천인계획’과 ‘만인계획’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실제로 SMIC 창립자 장루징, 양자통신 연구자 판젠웨이 등은 ‘천인계획’을 통해 귀국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이끌었다. 중국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국가 전략과 연계된 인재 정책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인재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과학기술 인재 전략본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해외 인재 유치와 국내 육성의 병행이 중요하다. 해외 우수 과학자의 귀국·협력을 유도하고, 청년-중견-리더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성과 중심의 차별적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탁월한 연구자에게 과감한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 과학자에게는 조기 연구 기회와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 인재의 사회적 위상 제고가 요구된다. 장학금, 병역 혜택, 연금, 주거 지원 등 다차원적 인센티브로 이공계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는 초당적·법제적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10~20년 단위의 장기 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결국 중국의 사례는 과학 기술 인재 확보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과 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미래 전략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인재 육성과 사회적 위상 강화, 일관된 장기 전략 추진이 필수적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과학기술 인재 전략